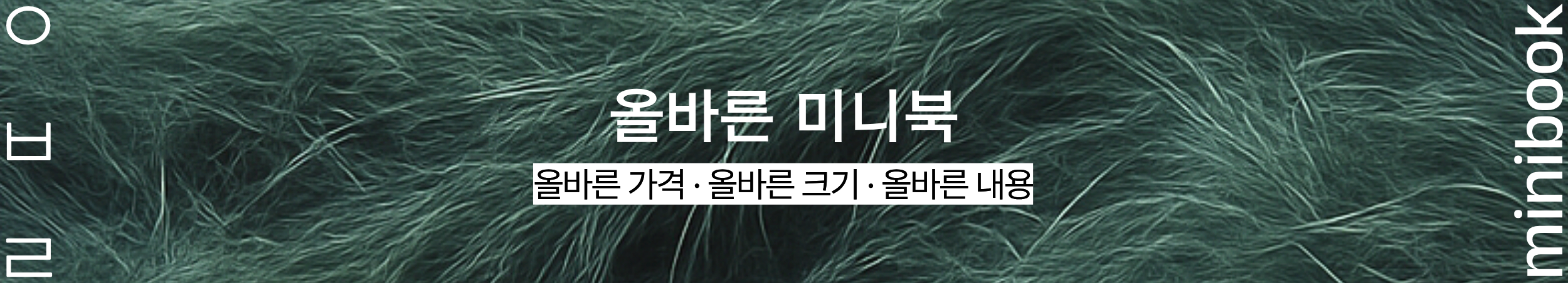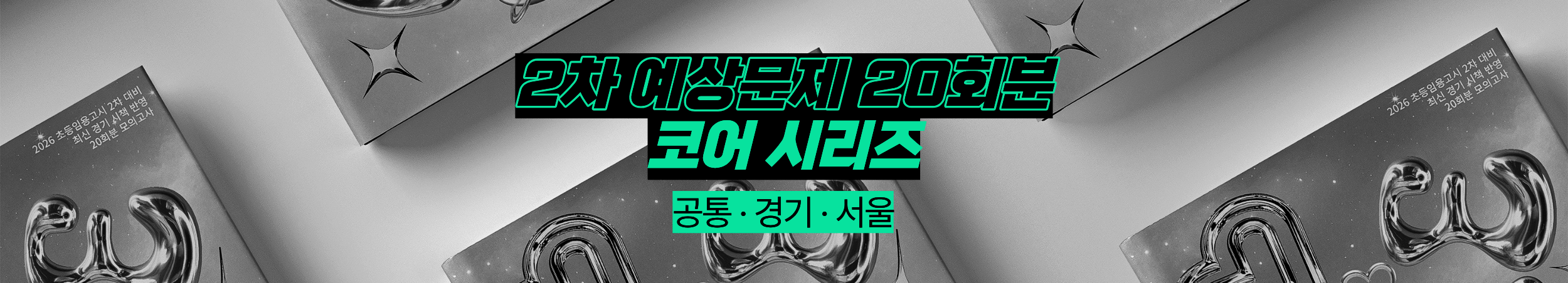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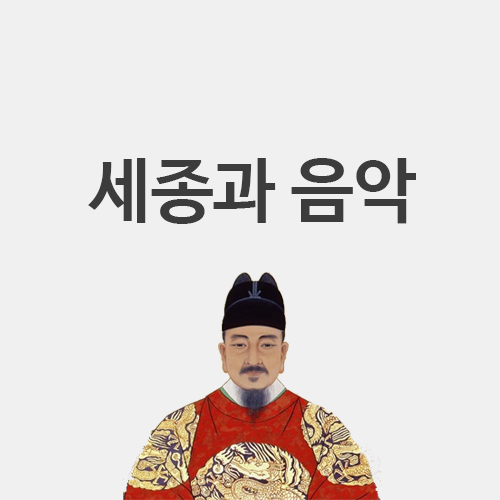
세종대왕과 음악
세종은 조선의 악성
우리 음악 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이 중 하나
세종은 직접 작곡한 곡의 악보를 실록에 남기고
박연에게 악기를 새로 만들고 궁중 음악을 정리하도록 함.
세종실록에는 음악과 관련된 기사가 유난히 많다.
그 중에는 특히 세종의 음악성을 보여주는 기록도 적지 않다.
세종 15년 1월 1일 기사에는 세종의 뛰어난 음악성이 나타난다.
새로 만든 악기 편경을 선보이는 날, 소리를 듣고 있던 세종이 악기 곁으로 다가왔다.
이 편경을 만든 실무책임자는 박연이었다.
세종은 유난히 소리가 높은 돌 하나를 지적했다.
그 돌은 먹줄 하나 만큼의 두께가 차이가 았다.
편경은 옥돌이라는 경석으로 만든다.
편경은 모두 16개의 돌이 각기 다른 음을 내도록 만들어지는데
돌의 모양은 모두 같게 만든다.
먼저 경석 위에 먹줄로 모양을 잡은 다음 돌을 잘라낸다.
경석은 철사줄로 자르는데 이때 입자가 고운 모래를 계속 뿌리면서 갈아낸다.
먹줄을 갈아주는데 두꺼우면 음이 높고 얕으면 음이 낮다.
먹줄 하나는 반음의 10분의 1.
그 정도의 음의 차이를 구별할 정도 음감이 좋았다.
편경은 모든 악기의 기준인 조율 악기다.
돌로 되어 있어 기후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음.
연주 방식에 따라서도 음고가 달라지지도 않고
일정한 음을 유지하기에 조율악기로 사용됨.
악기는 우주의 소리를 모두 담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다.
따라서 악기는 모두 자연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든 타악기인 어와 축,
흙으로 만든 질그릇 악기로 만든 부와 훈이 있으며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적도 있다.
이러한 악기로 우주의 소리를 담으려 한 것이다.
유교 음악에서 8음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8가지 개념으로 돌, 쇠,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다.
모든 악기를 갖추고 훌륭한 음악을 정립하려 한 세종.
조선은 유교. 즉, 성리학을 기초로 세운 나라였다.
성리는 성리학의 교과서와 같은 책.
세종은 이 책을 전국에 보급시켰다.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려는 의도였다.
성리대전의 한 권인 율려신서는 음악 이론서다.
음악을 통치의 한 부분으로 여긴 것이다.
음악의 시작은 황종음에서 비롯된다고 되어 있다.
황종의 황인 노란 색은 중심을 나타내고 가장 고귀한 색으로 황종음은 다른 음들의 기준이 되는 기본음이다.
이때 조선의 음악을 맡았던 인물이 박연이었다.
박연은 세종에게 조선의 음악을 정리해야 한다는 상소를 39편이나 올렸다.
그 중 황종율관을 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준음인 황종을 내는 기구 그것이 황종율관이었다.
황종율관의 황종음은 기장알 90개 길이의 대나무관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박연은 중국의 방시 그대로 황종율관을 제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중국에서 보내온 펴경의 황종음보다 약간 높았던 것이다.
세종은 박연의 실패 원인을 간파했다.
우리나라가 동쪽 끝에 위치해 있어 풍토가 중국과 다른데 우리나라의 대나무로 황종관을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나라는 중국과 소리가 다르기에
중국의 옛 제도를 따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박연은 다시 몇 차례의 시도 끝에 황종율관을 완성한다.
화아종음은 '도'보다 약간 높은 소리
황종율관에서 3분의 1을 자른 것은 임종음 솔
임종음에서 3분의 1을 더하면 태주음 레
여기에서 다시 3분의 1을 작은 것은 남려 라
이렇게 3분의 1을 더하거나 줄이는 삼분손익법으로 12음을 모두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황종율관은 단순히 음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황종율관은 도량형의 기준이 되었다.
황종율관의 길이를 기준으로 황종척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용도에 맞는 다양한 자가 만들어졌다.
황종율관은 부피의 기준도 되었다.
황종율관에는 기장알 1200개가 들어갔다.
이 황종율관 2개의 양을 1홉으로 삼았다.
그리고 10홉은 1되,
10되는 1말이 되었다.
이렇게 정해진 도량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한 것이 남아있다.
강의 수위를 재던 수표.
수표는 세종 때 처음 청계천이 설치되었다.
수표에는 수위를 재는 눈금이 생겨져있는데 모두 가뭄과 홍수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수표 눈금의 1금은 1주척.
음악에 대한 세종의 관심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특별한 의도에서 황종음을 찾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도량형을 통일했다.
좋은 음악은 좋은 정치의 수단. 풍속과 민심과 관련련.
세종의 음악 정비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왔던 박연은 대금을 아주 잘 불었으며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통치에서 음악의 역할을 강조한 이는 공자로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은 예악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문묘제례악은 춤과 함께 연주된다.
춤은 예법이 갖추어진 태평성대의 동작을 표현한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문묘제례악은 박연이 복원한 아악이다.
아악을 조선이 복원했다는 것은 세종의 자부심이다.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아악이 복원되며 왕실의 위용과 법도가 선명해졌다.
세종의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은 뒤에는 아악을 듣게 되는 셈인데
제사 지낼 때 우리 음악을 쓰는 건 어떠한가는 세종의 생각.
박연은 이에 반대했고
맹사성은 향악을 버리지 말고 아악을 사용한 뒤에 향악을 겸해서 쓰자고 하였다.
아악은 박연, 향악은 맹사성이 담당하게 되었다.
세종의 의도는 아악을 바탕으로 향악을 만들어 그것을 음악의 기준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세종은 자신이 직접 우리 음악을 작곡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아악을 정비한 이후 막대기로 땅을 치면서 하루 저녁에 다 만들었다고 한다.
세종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우리 음악에 담아 많은 사람들과 즐기고 싶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건국이 하늘의 뜻이며 역사의 필연이라는 것을 천명한 노래로
세종은 신하들이 지어올린 이 용비어천가 가사에 직접 가락을 붙였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작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고 즐기게 하려는 세종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
정대업, 보태평 만들 때 우리 음악인 향악을 바탕으로 함.
널리 불리던 서경별곡, 청산별곡 등의 가사를 바꿔 붙이고
길이를 조정하여 새 음악을 만들었다.
스크래치 도와주는 곳? 과제헬퍼 검색
'초등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악 현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양금) (0) | 2020.12.10 |
|---|---|
| 국악의 특징과 음계 (구음 12율) & 기본 선법과 악기 분류 방법 (1) | 2020.12.09 |
| 국악의 구분과 종묘제례악 (아악, 당악, 향악 vs 정악, 민속악) (0) | 2020.12.06 |
| [한국사] 백제의 문화 (유학, 불교, 도교, 기술) (0) | 2020.10.03 |
| [한국사] 백제의 통치 체제 (관등, 정치, 군사 조직) (0) | 2020.10.03 |